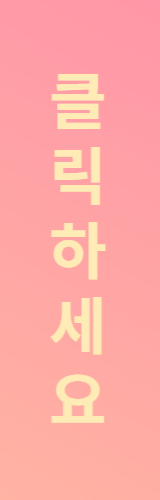공정하다는 착각, 스토리 저자 마이클 샌델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하버드 대학의 스타 교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었다. 책의 도입부에서 샌델교수는 2019년에 있었던 미국 부유층 자녀들의 대학 부정 입학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시험 감독관에게 뇌물을 줘서 SAT 성적을 조작하고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뇌물을 줘서 해당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체육 특기생으로 명문대에 진학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져서 2년 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많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그 분노의 기저에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가를 누려야 한다는 미국의 능력주의 신화가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능력주의를 신봉하지만 샌델 교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능력주의가 무조건 옳은 것일까? 설령 대학 입시가 완벽하게 공정해져서 학생들이 빈부 격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 과정은 승자에게만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선사할 것이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능력주의 신화는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굴욕과 모욕감을 선사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생산 시설을 저임금 국가로 아웃소싱해서 물가를 저렴하게 낮췄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자유시장 경제와 세계화의 혜택은 명문대를 나온 일부 상류층에게만 돌아갔고 학위를 갖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수입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이런 양극화를 정당화시켰다. 내가 가난한 건 재능이 부족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는 패자들에게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굴욕감을 선사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쌓여왔던 대중의 분노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표출되었다. 샌델 교수는 이런 포퓰리즘적 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 그리고 겸손함을 강조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오로지 본인들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행운이 작용했음을 아는 겸손함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단지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었던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연대감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었다. 동의하는 부분은 성공에는 행운이 필요하고 우리의 운명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확실히 오만함을 안겨줬다. 뉴스만 봐도 오만한 상류층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현재 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샌델교수의 주장의 무의식적인 전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샌델교수의 주장에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걸 느꼈다. 첫째, 인간은 선하고 정직하다. 둘째,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책의 중반부에서 샌델 교수님은 능력주의 사회와 귀족정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회가 더 공정한지 이야기하는데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고 가정하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하고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가난을 피하지 못한다. 그들의 자녀도 자녀의 자녀도 똑같은 운명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두 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똑같이 매우 높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둘 중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겠는가.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다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샌델교수의 생각은 좀 달랐다. 만일 봉건사회에서 농로로 태어났다면 힘들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낮은 지위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부담은 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도록 일해서 받들여야 할 지주가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해서 그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볼 것이다. 그 부모의 부와 영향력으로 저절로 상류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스스로 확신에 차서 나는 이 일에 최적 격인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를 공개경쟁으로 따낸 게 아님을 알고 있고 그가 만일 정직하다면 자신의 하급자 가운데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샌델교수님은 대부분의 인간이 정직하고 선하다는 전제 아래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